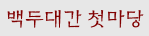백두대간 사람들18 두타산- 50개 우물을 향한 기도가 왜 죄가되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강 댓글 0건 조회 235,476회 작성일 18-08-28 12:14본문
산꼭대기에 50개 우물이 있다는 쉰움산은 산이라기보다 차라리 능선에 가깝다. 두타산에서 시작한 능선이 곧게 동쪽 바다로 뻗어내리다 살짝 고개를 든 모습인 쉰움산 정상은 바위로 이뤄져 있다. 바위에는 크기도 가지각색이고 모양도 제각각인 웅덩이가 널려 있다. 언뜻 보기에도 50개가 훨씬 넘어 보이는 웅덩이에는 무당개구리들이 짝짓기에 열을 올릴 만큼 물들이 가득하다. 웅덩이 물은 솟아나는 것이 아닌데도 좀처럼 마르는 일이 없다고 했다.
“박통 때 무장공비 나온다고 철거하기 전까지만 해도 쉰움산은 굉장했어요. 수 천명이 득시글댔으니까요.” 쉰움산 아래 내미로리 흥덕골에서 소여물로 쓸 밀을 수확하는 노보현(45)씨는 믿거나 말거나라며 오래지 않은 옛 이야기를 전한다. “고천리에 정광호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돌아가신 지가 한 5년쯤 됐나…. 이 분이 쉰움산에서 산 공부를 할 때 하루는 친구가 찾아갔더래요. 대접할 것이 변변치 않자 그 도시락 있죠, 알루미늄으로 된 거요. 그 위에 성냥을 한 개비 세우고 불을 붙였다 끈 뒤 도시락을 여니까 하얀 쌀밥이 가득하더래요.” 그야말로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는 산을 접어서 달렸다는 축지법으로 이어진다.
70년대 후반 무속신앙 정화라는 목적으로 산 속의 움막들과 기도터들이 헐려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기도객들과 무속인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삼척에 없는 물자도 쉰움산에 오면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이 전해지는 것도 기도객들과 함께 전국의 물자가 모였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
쉰움산에 이토록 많은 기도객들이 몰려든 것은 자식을 점지해달라는 기도를 잘 들어주었기 때문이라 한다. 두타산의 산신이 여신인데다 쉰움산 정상의 웅덩이들도 여성의 생식기를 상징한다. 옛 모습이 여전한 정상 한편 제단에는 곧추세워 놓은 돌들이 가득하다. 이 돌들이 웅덩이를 위로할 남성의 생식기인 셈이다. 삼척에서 “너도 쉰움산 정기를 받고 태어났느냐”라는 우스개를 쉽게 들을 수 있는 것도 쉰움산의 기자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쉰움산이 언제부터 민간신앙의 대상이 됐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단군을 민족사의 체계로 끌어들인 이승휴의 <제왕운기>가 편찬되던 1287년 훨씬 이전부터일 것이라 추측할 뿐이다. 이승휴가 살던 시대는 몽고족의 지배를 받던 시기였다. 고려 충렬왕에게 직언했다가 미움을 사 파직당한 이승휴는 외가가 있던 삼척 구동에 내려와 은거한다. 스스로 동안거사(動安居士)라 칭하며 배수고개 넘어 무릉계곡 삼화사의 모든 불경을 10년 동안 독파하기도 했다는 이승휴가 단군 왕검부터 고려 충렬왕까지의 민족사를 집대성한 것이 <제왕운기>다. 이승휴는 <제왕운기>에서 하늘과 산을 섬기는 민간신앙을 차용해 몽고족과는 동화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밝혀놓고 있다.
쉰움산에 전해 내려오는 또하나의 풍습이 ‘산멕이’ 치성이었다. 조상을 위해 기도를 하는 산멕이는 ‘귀신 소풍’이라고 부르기도 할 만큼 놀이로서의 기능도 강했다고 한다. 봄산에 올라 조상을 불러 ‘잔받이’를 시키고 가족의 화평을 빈다. 액막이를 겸하기도 하는 산멕이는 흥이 오르면 화전놀이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지난 한해 혹 쌓였을지 모를 갈등을 씻고 새 농사를 위한 대동단결을 다지는 자리였던 셈이다. 산멕이가 끝나면 사용했던 베나 실을 태우지 않고 마굿간에 걸어놓는데 해가 지나도 걷어 들이지 않는다.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효성이 지극한 것으로 여기는 데다 자손에게도 그만큼 복이 돌아온다고 믿은 탓이다.
민간신앙이 미신으로 내몰리면서 쉰움산에 오르는 발길은 현저히 줄었다. 단속 때문이었다. 정상 여기저기 바위틈이나 돌로 바람을 가린 작은 제단의 타다 남은 양초와 소주병 등은 단속의 눈길을 피해 늦은 밤에 산에 오른다는 기도객들이 남긴 흔적들이다. 옛날 양반들이나 찾던 무릉계곡이 강원도 국민관광지 1호로 지정돼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게다가 무릉계곡쪽에서 쉰움산을 오르려면 비탈을 한참 올라 두타산성으로 돌아야 한다. 옛길이 쌍용자원개발의 석회석 광산 개발로 끊어진 탓이다. 어찌된 연유인지 쉰움산에 있었다는 두타산사는 두타산의 남쪽 울타리인 댓재 마루에 있다. 그나마 문에 커다란 자물쇠가 걸려 있어 산신의 모습을 만나기도 쉽지 않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산을 울리는 발파음이 산을 놀라게 하는데 산신이라도 배겨내기 힘든 때문인지 아니면 쉰움산에 산사가 있었다는 기록이 잘못된 것인지는 가리지 못했다.
두타산에는 세 가지 모습이 남아 있다. 권력을 가졌던 양반들이 본 아름다운 경치와 불가의 사람들이 전하는 두타, 그리고 두타산을 신으로 섬기던 민중의 신앙이 그것이다. 불가에서 두타(頭陀)는 의식주에 대한 탐착을 버리고 몸과 마음을 닦는 12가지 수련법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다. 동고서저 지형이 유난한 두타산의 비탈은 몇 걸음 떼기도 전에 숨을 턱에까지 차오르게 한다.
양반의 풍류는 유적이 되고 삼화사와 천은사가 번성했던 옛 시절보다 더한 번성을 누리고 있다. 오직 한 가지 모습, 두타산을 신앙으로 여기던 민중의 모습만이 여전히 죄가 되고 있다.
삼화사가 발파음에 쫓겨 옛 자리보다 더 산에 가까운 무릉반석 위로 옮긴 것은 오히려 다행인 듯싶다. 이승휴가 10여년 불경을 읽고, <제왕운기>를 집필했다는 옛 터에는 이승휴를 기리는 사당이 있다.
감히 정상에 오르지도 못할 경외심으로 산을 대하고 두타산이 내준 능선 작은 봉우리 쉰움산 50개 우물에서 자손과 가족의 화목을 빌던 옛 민간신앙만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산 주변을 떠돌고 있다. 민족사의 정통성을 세웠다는 <제왕운기>의 사상적 기초도 하늘과 산을 섬기던 민간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만큼 귀한 신앙이 왜 죄가 되는지 이제는 따져봐야 할 일이다.
출처: http://100mt.tistory.com/entry/백두대간-사람들17-두타산-50개-우물을-향한-기도가-왜-죄가되는가 [<한겨레21> 신 백두대간 기행 블로그]
“박통 때 무장공비 나온다고 철거하기 전까지만 해도 쉰움산은 굉장했어요. 수 천명이 득시글댔으니까요.” 쉰움산 아래 내미로리 흥덕골에서 소여물로 쓸 밀을 수확하는 노보현(45)씨는 믿거나 말거나라며 오래지 않은 옛 이야기를 전한다. “고천리에 정광호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돌아가신 지가 한 5년쯤 됐나…. 이 분이 쉰움산에서 산 공부를 할 때 하루는 친구가 찾아갔더래요. 대접할 것이 변변치 않자 그 도시락 있죠, 알루미늄으로 된 거요. 그 위에 성냥을 한 개비 세우고 불을 붙였다 끈 뒤 도시락을 여니까 하얀 쌀밥이 가득하더래요.” 그야말로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는 산을 접어서 달렸다는 축지법으로 이어진다.
70년대 후반 무속신앙 정화라는 목적으로 산 속의 움막들과 기도터들이 헐려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기도객들과 무속인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삼척에 없는 물자도 쉰움산에 오면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이 전해지는 것도 기도객들과 함께 전국의 물자가 모였던 데서 비롯된 것이다.
쉰움산에 이토록 많은 기도객들이 몰려든 것은 자식을 점지해달라는 기도를 잘 들어주었기 때문이라 한다. 두타산의 산신이 여신인데다 쉰움산 정상의 웅덩이들도 여성의 생식기를 상징한다. 옛 모습이 여전한 정상 한편 제단에는 곧추세워 놓은 돌들이 가득하다. 이 돌들이 웅덩이를 위로할 남성의 생식기인 셈이다. 삼척에서 “너도 쉰움산 정기를 받고 태어났느냐”라는 우스개를 쉽게 들을 수 있는 것도 쉰움산의 기자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쉰움산이 언제부터 민간신앙의 대상이 됐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단군을 민족사의 체계로 끌어들인 이승휴의 <제왕운기>가 편찬되던 1287년 훨씬 이전부터일 것이라 추측할 뿐이다. 이승휴가 살던 시대는 몽고족의 지배를 받던 시기였다. 고려 충렬왕에게 직언했다가 미움을 사 파직당한 이승휴는 외가가 있던 삼척 구동에 내려와 은거한다. 스스로 동안거사(動安居士)라 칭하며 배수고개 넘어 무릉계곡 삼화사의 모든 불경을 10년 동안 독파하기도 했다는 이승휴가 단군 왕검부터 고려 충렬왕까지의 민족사를 집대성한 것이 <제왕운기>다. 이승휴는 <제왕운기>에서 하늘과 산을 섬기는 민간신앙을 차용해 몽고족과는 동화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밝혀놓고 있다.
쉰움산에 전해 내려오는 또하나의 풍습이 ‘산멕이’ 치성이었다. 조상을 위해 기도를 하는 산멕이는 ‘귀신 소풍’이라고 부르기도 할 만큼 놀이로서의 기능도 강했다고 한다. 봄산에 올라 조상을 불러 ‘잔받이’를 시키고 가족의 화평을 빈다. 액막이를 겸하기도 하는 산멕이는 흥이 오르면 화전놀이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지난 한해 혹 쌓였을지 모를 갈등을 씻고 새 농사를 위한 대동단결을 다지는 자리였던 셈이다. 산멕이가 끝나면 사용했던 베나 실을 태우지 않고 마굿간에 걸어놓는데 해가 지나도 걷어 들이지 않는다.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효성이 지극한 것으로 여기는 데다 자손에게도 그만큼 복이 돌아온다고 믿은 탓이다.
민간신앙이 미신으로 내몰리면서 쉰움산에 오르는 발길은 현저히 줄었다. 단속 때문이었다. 정상 여기저기 바위틈이나 돌로 바람을 가린 작은 제단의 타다 남은 양초와 소주병 등은 단속의 눈길을 피해 늦은 밤에 산에 오른다는 기도객들이 남긴 흔적들이다. 옛날 양반들이나 찾던 무릉계곡이 강원도 국민관광지 1호로 지정돼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게다가 무릉계곡쪽에서 쉰움산을 오르려면 비탈을 한참 올라 두타산성으로 돌아야 한다. 옛길이 쌍용자원개발의 석회석 광산 개발로 끊어진 탓이다. 어찌된 연유인지 쉰움산에 있었다는 두타산사는 두타산의 남쪽 울타리인 댓재 마루에 있다. 그나마 문에 커다란 자물쇠가 걸려 있어 산신의 모습을 만나기도 쉽지 않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산을 울리는 발파음이 산을 놀라게 하는데 산신이라도 배겨내기 힘든 때문인지 아니면 쉰움산에 산사가 있었다는 기록이 잘못된 것인지는 가리지 못했다.
두타산에는 세 가지 모습이 남아 있다. 권력을 가졌던 양반들이 본 아름다운 경치와 불가의 사람들이 전하는 두타, 그리고 두타산을 신으로 섬기던 민중의 신앙이 그것이다. 불가에서 두타(頭陀)는 의식주에 대한 탐착을 버리고 몸과 마음을 닦는 12가지 수련법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다. 동고서저 지형이 유난한 두타산의 비탈은 몇 걸음 떼기도 전에 숨을 턱에까지 차오르게 한다.
양반의 풍류는 유적이 되고 삼화사와 천은사가 번성했던 옛 시절보다 더한 번성을 누리고 있다. 오직 한 가지 모습, 두타산을 신앙으로 여기던 민중의 모습만이 여전히 죄가 되고 있다.
삼화사가 발파음에 쫓겨 옛 자리보다 더 산에 가까운 무릉반석 위로 옮긴 것은 오히려 다행인 듯싶다. 이승휴가 10여년 불경을 읽고, <제왕운기>를 집필했다는 옛 터에는 이승휴를 기리는 사당이 있다.
감히 정상에 오르지도 못할 경외심으로 산을 대하고 두타산이 내준 능선 작은 봉우리 쉰움산 50개 우물에서 자손과 가족의 화목을 빌던 옛 민간신앙만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산 주변을 떠돌고 있다. 민족사의 정통성을 세웠다는 <제왕운기>의 사상적 기초도 하늘과 산을 섬기던 민간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만큼 귀한 신앙이 왜 죄가 되는지 이제는 따져봐야 할 일이다.
출처: http://100mt.tistory.com/entry/백두대간-사람들17-두타산-50개-우물을-향한-기도가-왜-죄가되는가 [<한겨레21> 신 백두대간 기행 블로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